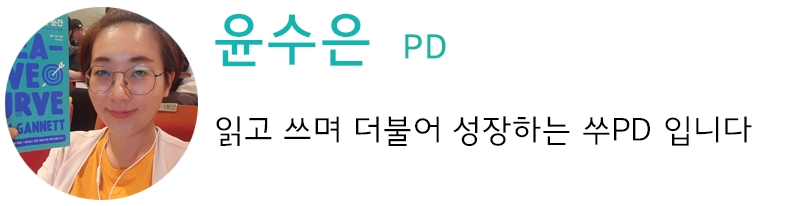코로나19로 떠오른 영단어 ‘언컨택트(Uncontact)’. 우리식 신조어로는 ‘언택트’로도 잘 알려졌다. ‘비대면, 비접촉’ 말 그대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용 앱을 통한 모임이다. 악수조차 꺼려지는 요즘, 세상에 유난스레 등장한 언컨택트는 콩글리쉬라는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었다.
세계 최초 ‘비대면’ 미디어, 책
그런데 가만히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틈틈이 ‘언컨택트’한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했다. 철학자이자 문화평론가 김용석 교수가 20년 전에 쓴 철학 에세이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중 ‘책을 위한 서문’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책은 휴대하는 문화 전달매체의 원조였다. (책을 얘기하면서 나는 벌써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잠자리에까지 가지고 가는 문화 매체다(앞으로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이 점을 전용하려고 눈독을 들일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잠자리에서 애무하듯 손가락 끝으로 정성스레 책장을 넘기며 읽은 책이 책상에 앉아 읽은 책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책읽기는 교육적 차원에서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전적으로 대면적 대화를 기본으로 하던 교육 제도에서 책은 스승으로부터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 책의 상징성이 가지는 위력은 디지털과 컴퓨터 시대에도 미친다. 우리는 휴대용 소형 PC를 ‘노트북’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도 책의 잔영은 볼 수 있다. – 본문 13쪽 – ]
라디오와 TV,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기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문자가 생겨난 이래 한 시대의 기록과 유산은 고스란히 종이 또는 점토판 같은 매체에 차곡차고 기록되고 편집돼 물리적인 형태로 100년 이상의 시간넘어 후대로 전해진다. 이 물리적인 형태가 바로 ‘책’이다. 우리는 책을 통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이전의 사람들과 만난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직접 만나지 않고서 말이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 제국 시절에 세워졌다고 하니, 당시 점토판(위 사진)에 새겨진 기록 모음을 책으로 봤을 땐 이미 3000년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역사다.
다만 오늘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책에만 국한됐던 ‘비대면’ 방식의 정보습득이 이제는 거의 모든 일상에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각종 모임과 금융거래가 대표적인 예다. 아무쪼록 쌍방향·실시간 소통이 비일비재한 요즘, 새삼 책이 갖고 있는 ‘비대면성’에 놀랐다. 책을 읽는 우리는 이미 코로나시대 이전에도 이미 저자와 ‘비대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를 언컨택트의 시대라며 살짝 호들갑을 떨었던 게, 돌이켜보니 조금 유난스러웠다는 생각도 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비대면’ 소통은 계속된다.
참고 도서
1)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김용석 저, 푸른숲
2) <언컨택트>, 김용섭 저, 퍼블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