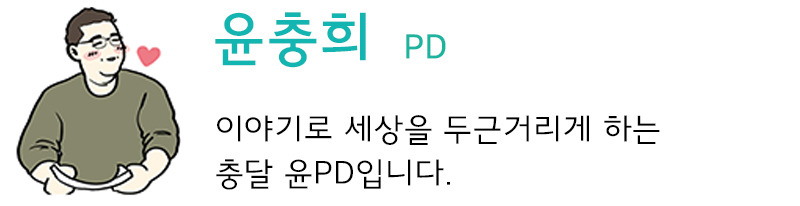천재는 언제나 매력적인 소재였다. 그들이 천재성을 발휘하는 순간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을 자아낸다. 마치 웅장한 자연경관이나 피라미드 같은 거대 건축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천재를 멀리서 보면 경이롭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천재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거나, 기행을 넘어 미쳐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민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렇게 천재를 다룬 작품 대부분은 천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관객을 천재의 편에 서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천재가 아니지 않은가? 관객처럼 천재와 경쟁할 필요가 없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천재가 마냥 신기할 뿐이다. 하지만 천재와 맞서고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들에게 천재는 태풍이자, 쓰나미고, 지진 같은 존재다. 기존 체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자연 재해급 충격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천재보다 천재를 훼방 놓는 사람들에게 더 공감했다. 왜냐면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천재의 성과를 보며 부러움과 좌절에 치를 떨었으니까. 내 주변에 나를 좌절케 한 세기의 천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천재의 작품은 꾸준히 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명작을 보며 감탄과 환희에 사로잡히겠지만, 나는 그들의 천재성 앞에서 질투에 사로잡혔다. 아직도 정지용의 시를 꺼내 볼 때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니… 그 표현력이 여전히 부럽다.
그래서 나는 천재를 다루면서도 천재가 주인공이 아닌 이 영화를 몹시 사랑한다. 천재를 향한 시기와 분노. 그 끝에서 드러나는 옹색한 인간 내면의 한계. 그 모두를 녹여낸 작품. 내 인생 최고의 영화라고 언제나 꼽았던 작품. 바로 밀로스 포먼 감독의 명작 <아마데우스>다.
<아마데우스>는 항간에 떠돌던 소문을 영화화했다. 바로 모차르트가 유령으로 변장한 살리에리에게 암살당했다는 소문이다.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모차르트 앞에 아버지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진혼곡을 작곡해 달라고 의뢰한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렸고,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진혼곡은 모차르트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용된다. 영화는 그 유령이 바로 살리에리의 음모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살리에리는 당시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곡가였다. 어쩌면 당시에는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를 부러워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 그런 그가 모차르트를 시기할 이유는 없다. 죽음으로 몰아갈 이유는 더더욱 없다. 역사적 사실 위에 허구를 덧씌운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여럿 있다. 우리나라에도 <광해> 같은 작품이 존재한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허구를 섞은 이런 이야기를 ‘팩션(팩트+픽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아마데우스>에서 허구인 지점은 사건만이 아니었다. 영화의 중심이자 실존 인물이었던 모차르트의 묘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영화 속 모차르트는 천재의 전형을 보여준다. 거꾸로 말하기가 가능하고, 한 번 들은 곡은 완벽히 외우며, 즉석 편곡까지 해낸다. 모차르트에게 작곡이란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을 그저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일이었으며, 그 덕에 모든 초고가 완성본이 되는 기적의 업무 효율을 보여준다. 모차르트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 아래 나는 아무런 비판 없이 이 모습이 진짜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마 모차르트의 실체를 알고 나면 ‘팩션’이라는 명칭조차 부당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선 모차르트는 성실했다. 영화에서는 툭하면 파티나 다니며 흥청망청 돈을 쓰는 망나니처럼 그려지지만, 그가 작곡한 곡은 무려 626편에 달한다. 이 곡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는가? 모차르트가 35살에 요절했으니, 태어나자마자 곡을 쓰기 시작했더라도 1년에 17편, 한 달에 한 편 이상 곡을 쓴 셈이다. 한 달에 글 한 편 안 쓰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모차르트는 한 달에 한 편 이상 곡을 썼다. 626이라는 숫자는 모차르트의 성실함을 증명해준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의 이미지와도 다르다.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는 이런 대사를 한다.
“곡? 모두 머리 속에 있어. 이제 쓰기만 하면 돼. 술 마시고, 술 마시고, 긁적, 긁적…”
명곡을 뚝뚝딱딱 찍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 전형적인 천재의 모습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다. 모차르트는 626편이나 작곡했다. 그 중에는 수백 년 동안 사랑받은 명곡도 있지만, 누구 곡인지도 모르게 묻
혀버린 작품도 존재한다. 모차르트는 명곡을 찍어내는 신이 내린 천재가 아니었다. 몇 곡의 명곡을 만들기 위해 수백 곡을 작곡해야만 했다. 천재라는 판타지의 주인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매우 반복적이고 고된 과정을 거쳐 오랜 시간을 작곡에 투자했다. 스스로 작곡한 곡을 가리켜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의 소산’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영화처럼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이 초고가 완성본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세살부터 음악가로서 조기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본인만의 독창적인 협주곡은 17살에 나왔다. 물론 17살도 어린 나이지만, 그가 14년 동안 체계적인 음악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다지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모차르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는 아닌 셈이다.
이처럼 사실과 픽션이 혼재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사실이라 부를만한 요소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를 천재의 전형으로 만들었고, 천재라는 신화를 구축했다. <아마데우스>의 천재 공식을 따르는 수많은 아류 천재 영화가 쏟아졌고, 그 안에서 천재의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 되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뚝딱뚝딱 해치우는 천재들. 그리고 이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보통 사람들. 이 구도가 극적인 건 사실이다. 재밌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진실은 더더욱 아니다.
천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을 거쳐야 하고, 많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며, 무엇보다 때와 장소를 잘 만나는 운도 따라야 한다. <아마데우스>는 천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작품이다. 거짓 천재 판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럼 <아마데우스>는 명작이 아니라 나쁜 작품이 되는 걸까?
<아마데우스>의 이야기가 흥미를 끌어내는 지점은 모차르트가 맞다. 그의 놀라운 천재성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제의 핵심은 모차르트의 신기한 묘기가 아니다. <아마데우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살리에리다. 그가 보여준 질투와 분노 그리고 고통이 바로 영화의 핵심이다. 비록 <아마데우스>가 ‘실화’는 아니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영화는 허구다. 그리고 <아마데우스>는 그 어떤 픽션 중에서도 가장 깊고 섬세하게 ‘질투’를 다룬 작품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가 타인을 질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보다 나으면 절대 질투할리가 없다. 생각해봐라. 아무리 이재용이 부자라고 한들 만수르가 그를 부러워하겠는가? 남과 비교하니 상대적인 부족함이 보이고, 그 부족함을 단숨에 채울 수 없으니 불만이 싹트는 것이다.
‘비교’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다.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남보다 못나면 비참할 뿐이고, 남보다 나으면 우쭐해지기 십상이다. 그리고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는 그 둘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 앞에서 언제나 비참했다. 본인도 충분히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나중에는 모차르트를 죽음에 몰아 넣는다. 그리고는 스스로 신에게 이겼다며 자랑스러워한다. 다 늙은 노인이 정신병동을 지나며 ‘나는 보통 사람의 챔피언이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장면은 많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그 장면만큼 ‘교만’한 인간을 또 볼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애처로울 정도로 비참해 보이기도 한다. 존재의 이유가 모차르트로 시작해 모차르트로 끝나다니 말이다.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모두를 한 번에 보여준 영화. 비록 천재 판타지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마데우스>를 명작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