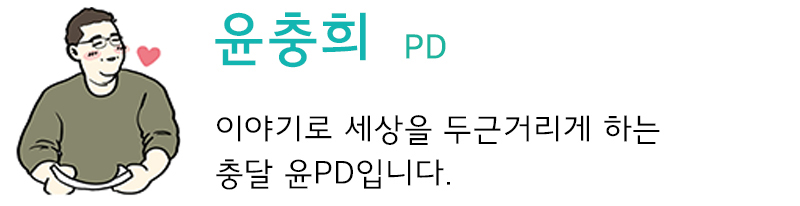“저는 의욕은 있는데 의지가 없나 봐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벌이는데 끝까지 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고민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은 92%라고 생각한다. 왜냐고? 우리 모두 새해에는 다짐을 하지 않던가? 종이에 써서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 되뇌고 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해에는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새해 계획을 해내는 경우는 겨우 8%에 불과하다고 한다. 새해 계획의 92%는 실패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이를 위해서는 2가지를 알아야 한다. ‘피해야 할 것’ 하나, 그리고 ‘꼭 해야 할 것’ 하나다. 이 2가지를 알면 당신도 흐지부지 인생을 탈피하고 마침표를 찍는 인생을 살 수 있다.
1) 피해야 할 것 : 완벽주의
책 <피니시>의 저자 존 에이커프는 완벽주의를 가리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악당”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녹즙을 챙겨 먹기로 했다. 그래서 녹즙기도 사고, 신선한 녹황색 채소도 구입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가족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처음 며칠간은 별문제 없이 녹즙을 먹는다. 막 몸에서 독소가 나가는 것 같고, 뇌가 맑아지는 기분이다. 딱 12일째 되는 날까지만…
왜 12일이냐면 13일째 되는 날 당신은 매우 바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날 회식이 있어 술을 진탕 마시고 온 덕분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새벽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 일찍 출근했을 수도 있으며, 어제부터 해외로 출장 온 탓에 녹즙을 마실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유가 뭐가 됐건 당신은 그날 이후로 녹즙 마시기를 포기한다. 그동안 들인 노력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내 그랄 줄 알았다라는 눈빛으로 처다본다)
이런 패턴을 겪는 사람이 많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다면 관두는 편이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애초에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한두 번 망한다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한두 번은 삐끗할 수 있다. 오늘 하루 운동을 빼먹었을 수도 있고, 낮에 초코크림이 잔뜩 들어간 도넛을 먹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목표가 3kg 감량이라면 다음에 더 노력해서 오늘의 실수를 만회하면 된다. 어쨌든 3kg만 감량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지 않은가?
존 에이커프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불완전함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왜냐면 완벽하지 않은 날이야말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끝까지 해내고 싶다면 완벽하지 않은 날을 쿨하게 넘겨야 한다. 당신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꼭 해야 할 것 : 아웃풋
그럼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짐을 어겨도 괜찮을까?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 “내가 새해 다짐으로 뭘 계획했더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아웃풋이다. 즉, 결과물을 내야 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시간을 내어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겠지만, 막상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책이 재밌으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겠는데, 내용도 어렵고 재미도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고픈 의욕(?)이 솟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불완전해도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꼭 책을 다 읽어야 서평을 쓸 수 있을까? 결말이 중요한 소설 같은 분야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근데 소설은 재밌잖아), 논픽션의 경우 챕터마다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딱 한 챕터만 읽어도 서평을 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면 “다 읽지도 않고 쓴 서평이 도움이 되겠어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보자면 “불완전한 결과물을 어따 써먹어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완전한 결과물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심지어 완벽한 결과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책 <학습하는 조직>에서는 비행기 개발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당시 가장 앞서가는 두 조직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였고, 다른 하나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인 새뮤얼 랭글리의 팀이었다. 두 팀은 개발 과정이 전혀 달랐는데, 최고 석학이었던 새뮤얼 랭글리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비행기를 설계하면서 개발을 추진했다. 반면, 자전거 상점 출신인 라이트 형제는 일단 비행기를 만들고, 띄우고, 추락하기를 반복하면서 개발을 진행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라이트 형제의 승리였다.
라이트 형제의 방식을 학습주의라고 한다. 개발의 모든 단계를 세세하게 준비하기보다 준비가 부족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시험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피드백하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인 ‘애자일’, ‘린 스타트업’ 등도 학습주의를 바탕에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링크트인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당신 제품의 첫 번째 버전이 부끄럽지 않다면, 출시가 너무 늦은 것이다.”
즉, 결과물에 있어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서평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가는 영원히 서평을 못 쓰게 될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결과물을 내보자. 결과물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결과물이라도 그것이 히든 에셋이 되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벽함을 노리다가 끝을 내지 못하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끝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러니 무조건 아웃풋을 내자. 어쨌든 끝을 보자. 그렇게 결과물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만족스럽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고
1) 책 <피니시>
2) 책 <학습하는 조직>
3) 이미지 출처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