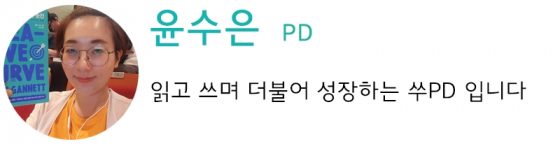취업을 하는 순간,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회사에서 보내거나 혹은 회사 일로 보내게 된다. 하루 24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8시간(법정근로시간)은 회사를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직장 얘기를 빼놓을 수도 없고, 직장 얘기는 주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소재기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가족같은 직장’이란 제목으로 15년 전 기사의 일부를 캡처한 내용이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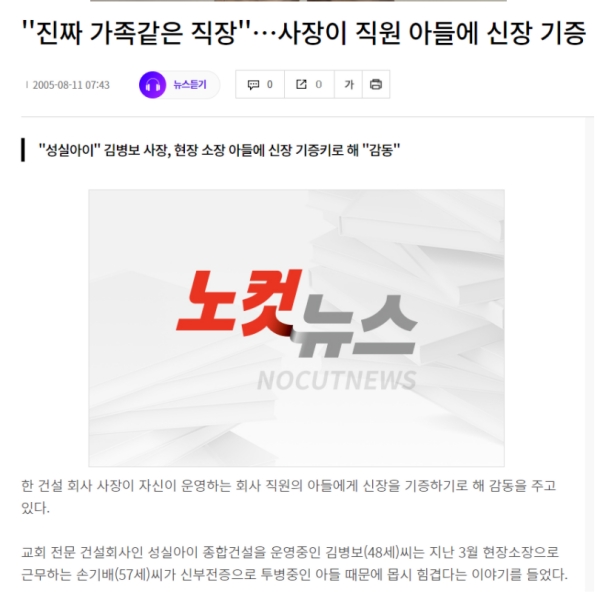
삭막함, 사내정치, 뒷담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직장생활 속에서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함을 깨닫게 한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장이 직원의 자식의 위중함을 알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꽤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입소문으로 돌고 있는 건, 회사생활에서 따뜻한 정을 그리워함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물론 위와 같은 사례는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경우다. 그렇다면 진짜 가족같은 장은 어디일까? 책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건의 하나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을 꼽았다. 집단 내의 안전한 교류를 형성하는 일련의 행동을 ‘소속 신호’라고 하는데 이 신호는 개인의 머릿속에서 3가지 질문을 던진다. 1) 이곳은 지금 안전한가 2)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3) 위험요소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모두 긍정적이라면 바로 그 조직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이 심리적 안전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의 구성원 각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한다. 역시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가족같은 직장을 찾기 전에,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드는 구성원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일테다.
참고
1. <진짜 가족같은 직장.jpg>, 웃긴대학 (링크)
2. <“진짜 가족같은 직장”… 사징이 직원 아들에 신장 기증>, 노컷뉴스(링크)
3.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대니얼 코일 저, 웅진지식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