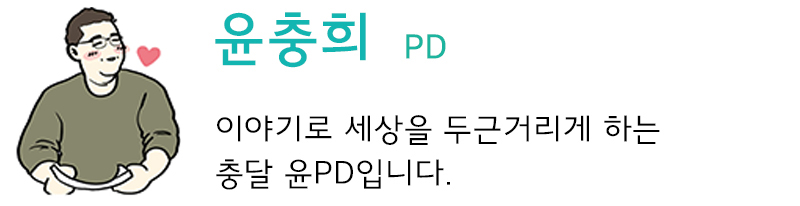충남 부여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70대 남성이 시장에서 광어와 곰치를 사려고 했는데, 그만 생선 장수의 실수로 곰치가 아닌 맹독성 복어를 담아주고 말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생 선장수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복어를 사 간 손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다행히 생선 장수가 CCTV를 통해 복어를 사 간 사람을 찾아냈고, 경찰은 주변과 버스의 CCTV를 판독해 손님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맹독성 복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다. 다행히 복어는 아직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봉지에 담겨 있었다.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말이 있다. 파놉티콘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로, 중심에 위치한 감시자들이 주변의 수감자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수단이 등장하면서 현대 사회가 마치 파놉티콘처럼 ‘모든 것이, 전 방위적으로, 도처에서, 모두에 의해’ 감시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를 두고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덕분에 범인 검거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범행 장소에서 벗어날 때까지 CCTV를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CCTV를 전부 파악하여 피하더라도 불시에 튀어나오는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
CCTV뿐만 아니라 SNS도 디지털 파놉티콘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FBI는 페이스북이 등장했을 때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페이스북에 직접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망친 범인을 검거한다거나,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도 한다. 잡아야 할 사람이 알아서 ‘나 여기 있수~’하는 꼴이니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환호성이 나올 수밖에.
이러한 디지털 파놉티콘이 인권, 특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제는 내가 언제 집을 나서고 언제 돌아왔는지 CCTV만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는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러한 감시 장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 CCTV를 철수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웨어러블 장비까지 등장하고 있어 디지털 파놉티콘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정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나쁜 짓을 누군가는 반드시 목격한다. 게다가 그게 사람이 아니라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다.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보다도 강력한 물증이 남는다는 말이다. 비밀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진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안티프레질한 행동 습관이 될 것이다.
참고 : [현장] 실수로 ‘맹독성 복어’ 판 생선 장수…한밤중 복어 찾기 대소동, 연합뉴스 (링크)
이미지 출처 : 영화 <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