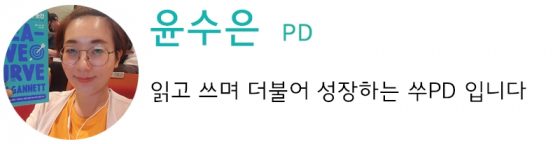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는 건 개인 뿐만이 아니다. 기업 역시 ‘사회공헌’, 즉 CSR이란 이름으로 회사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사회공동체에 기부한다. 기부 단체에 금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업종의 특성을 살려 무료 교육 등으로 관련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코즈(Cause)마케팅’을 펼치는데, ‘코즈마케팅’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이슈를 연계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통해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걸 의미한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신발 회사에서 고객이 자사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신발 없이 살고 있는 빈민국 아이들에게 똑같이 신발 한 켤레를 전달하는 것이다. 신발을 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구매함과 동시에 어려운 아이들도 도왔으니 두 배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다.
하지만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바로 10년 전 한 피자 회사에서 실시한 기부 마케팅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자 돼 네티즌들의 뜨거운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이른바 이 캠페인은 2분의1 프로젝트 피자(15% 할인가)를 주문하면 피자의 절반만 배달이 되고 나머지 절반과 피자회사가 기부하는 절반이 모여 총 한판의 피자가 고객의 이름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취지는 좋았다. 소외계층에게 맛있는 피자를 주고 싶은 의도였을테니까.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다. 할인은 15%인데, 막상 받은 피자는 절반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다. 한 달 반 동안 실시한 이 캠페인은 공식 블로그에서도 비판 댓글 세례를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안내가 다 돼 있었고, 주문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주문해놓고 욕만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최근에 쓴 아름다운 가게 기부물품 글도 그렇고, 이번 글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진정한 기부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다.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건, 내가 ‘선하다’는 걸 드러내는 열정이 아니라 회사도 소비자도 ‘윈윈’할 수 있는 냉정일 것이다.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피자회사의 사례에서도 이 진리는 통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권하지 말라(내가 쓰지 못하는 물건을 남에게 주지 말라)’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듯, 손해보는 구매를 누가 하고 싶겠는가. 그것이 비록 누군가를 돕는 일일지라도.
<참고>
1. 전설의 OOO 피자 사건, 웃긴대학 (링크)
2. [코즈마케팅] 좋은 기업의 착한 마케팅, 코즈마케팅, 대학생연합광고동아리 AD.FLASH(링크)
<관련기사>
아름다운 가게에서 폐기로 분류한 기부물품(링크)